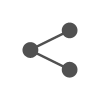미국서 겉돌고 ‘뿌리’ 찾아 한국으로…한국서는 언어·편견 장벽
정체성을 찾아 한국을 찾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 2세들의 어려움을
미국 방송 CNN이 14일(현지시간) 조명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케빈 램버트 씨는 2009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늘 따돌림을 받았고 언제나 겉도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램버트 씨의 사례처럼 수십 년 전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국에 정착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CNN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에 만연한 인종차별, 총기 폭력,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조상의 고향에서 소속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은 약 4만3천명으로 2005년의 2배가 넘는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연구하는 스티븐 조 서 교수는 “이렇게 뿌리를 찾아 복귀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아시아’ 하면 일본과 중국을 떠올리는 강한 고정관념이 미국에 팽배하던 시기에 자랐다”고 설명했다.
인종차별적인 경험과 ‘완전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그들이 부모의 고향에 가는 것을 고려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그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다. 한국을 찾은 이민 2세 대부분은 결국 미국으로 되돌아간다.
서 교수는 역이민 연구를 위해 7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모든 사람이 ‘인종’, ‘인종차별’, ‘민족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대니얼 오씨는 8년 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현지 문화를 잘 알아도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은 처음 왔을 때부터 고향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도 집을 구할 때,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등에 언어 장벽과 익숙지 않은 절차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씨는 특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중 잣대’를 느낄 때 힘들다고 밝혔다. 어떨 때는 외국인 취급을 받지만,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한국인 아니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그들의 부모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겪은 일들이기도 하다.
차이점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캘리포니아 아시아센터의 지연 조 디렉터는 “민족 내 차별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간의 인종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2세들은 한국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여성은 한국의 보수적인 관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서 교수는 이민 2세 여성들이 한국에서 “너무 노골적이고, 얌전하지 않고, 페미니스트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선망받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여성을 만나기가 어렵다. 영어 교사가 되기는 쉽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비자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씨는 경력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는 걱정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서울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과 달리 한국에 완전히 녹아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체성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 교수는 한국에 온 이민 2세들은 한국인이 정의하는 ‘한국인다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느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