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두리사구에 200마리 방사…한우 5마리로 똥밭 조성
똥을 먹고 사는 딱정벌레 소똥구리.
편평하고 검은 등판에는 광택이 없다.
과거 제주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 살았지만 가축을 풀어놓지 않고 우리에서 기르게 되면서, 가축에게 항생제를 첨가한 사료를 먹이고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터전인 똥밭이 사라졌다.
1969년 8월 이후 공식적으로 채집된 적 없고 올해 4월에는 한국에서 절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 소똥구리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에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몽골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소똥구리 830마리를 도입했다. 한국 소똥구리와 몽골 소똥구리는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다.
국내에서 증식된 개체를 포함하면 1천마리 정도 되는데, 이 중 200마리가 신두리사구에 입주했다.
한 번에 200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유효 개체군 크기(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개체수)를 200마리로 보기 때문이다.
소똥구리가 경단을 굴리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한 행동이다. 똥으로 만든 집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40일 정도면 우화하고 2∼3년 산다.
경단을 굴려야 하기에 피복도(식물이 표면을 덮은 정도)가 20∼40%로 낮고 물기가 많지 않은 모래벌판을 좋아한다.
신두리사구는 이런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안군이 자체적으로 한우 5마리를 풀어 소똥구리 서식지를 복원해온 점도 고려됐다.
소똥구리 복원 필요성은 이들이 생태계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경단을 굴리고 모래에 묻는 과정에서 땅에 숨구멍이 만들어지고, 깊은 토양에까지 유기물질과 영양분이 공급된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분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분해되지 않은 대형초식동물 분변을 그대로 둘 경우 꼬일 수 있는 파리나 기생충을 줄여준다는 이점도 있다. 분변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도 적어진다.
환경부는 신두리사구 소똥구리 개체군이 1천마리까지 늘어날 경우 복원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두리사구 똥밭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가축을 방목해 기르는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소똥구리가 자연적으로 서식지를 확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두리사구에 방사한 다음 실제로 소똥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면서 “방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염풍뎅이와 닻무늬길앞잡이 등 멸종위기종도 복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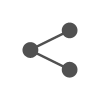










![[우리동네 맛집] 둘루스 ‘이바돔 감자탕’ … 녹진한 맛으로 가득찬 한 상](https://atlantaradiokorea.com/wp-content/uploads/2025/09/KakaoTalk_20250915_144136772_06-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