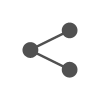2022년 21만건으로 최대…2020년엔 결혼 건수 앞질러
시민연대협약, 사회·경제적 혜택 같지만 결혼보다 ‘유연’
프랑스 파리에 사는 마리옹(30·가명)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인 남자친구와 시민연대협약(PACS·팍스)을 맺고 함께 살고 있다.
남자친구의 비자 문제도 있지만, 두 사람이 소득 신고를 함께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마리옹은 18일(현지시간) “팍스를 하면 단순 동거 커플보다 집주인이 더 신뢰하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도 더 쉽고 집을 살 때도 은행 대출이 덜 까다롭다”고 말했다.
같은 해 전통적인 결혼을 한 부부는 24만1천710쌍으로, 팍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프랑스 전역에 이동제한령이 발동된 2020년에는 사상 처음 팍스(17만여건)가 결혼(15만여건) 건수를 2만건 앞지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팍스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꾸려가도록 만든 제도다.
팍스 도입에 앞장섰던 파트리크 블로슈 전 사회당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민법에서 동성 커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일간 르피가로에 설명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체 팍스 건수 중 동성 간 계약 비중은 극히 일부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9년 42%로 가장 높았다가 2004년 13%로 떨어졌고, 이후 내리 한 자릿수 비율을 보인다. 2022년에도 이성 간 팍스는 19만9천여건 체결됐으나, 동성 간 팍스는 1만350건으로 전체의 5%에 그쳤다.
사실상 이성 커플 간 결속 제도로 팍스가 자리 잡은 데는 결혼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혜택은 누리면서도 법적·행정 절차는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팍스 커플도 결혼한 부부처럼 세제 혜택, 건강보험 혜택, 자녀 교육 지원 등을 받는다.
마리옹은 “결혼한 커플은 헤어질 경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엔 돈도 상당히 든다”며 “팍스는 구청에 가서 계약을 끝낸다고 통지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젊은 커플은 정식 결혼의 사전 단계로 팍스를 결정하기도 한다. 마리옹도 앞으로 몇 년간 돈을 더 모아 집 장만과 결혼식을 올릴 여유가 되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계획이다.
팍스가 전통적 결혼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보니 커플 간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있다.
일간 피가로에 따르면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기혼자의 80%가 결혼 날짜를 자연스럽게 말한 반면, 팍스를 맺은 사람 가운데엔 40%만 계약 날짜를 즉각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가로는 “이는 커플들이 보다 유연하고 덜 형식적인 형태의 결합에 결혼보다 덜 신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