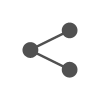퓰리처 수상 작가, 골든글로브 ‘이중잣대’ 지적

미국 국적의 감독과 배우가 출연해 한국계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강력하게 던졌다는 내용의 칼럼을 워싱턴포스트(WP)가 실었다.
베트남계 미국인 유명 작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 비엣 타인 응우옌은 24일(현지시간) 이 신문에 ‘미나리는 한국어를 쓰는 이민자에 대한 영화다. 그렇다고 미나리를 ‘외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응우옌은 “미나리 감독인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은 미국인이고, 미국인 배우를 캐스팅했으며 미국에서 제작됐다”라며 “대사 대부분은 한국어이지만, 이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결정은 ‘외국적’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라고 해설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최근 출품작에 대한 연례 심사를 마쳤다며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부문으로 분류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연출했으며,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한 미국 영화다.
미국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 글로브는 아카데미보다 먼저 열리며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린다.
HFPA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미나리에서는 주로 한국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외국어 영화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은 1975년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가 집에서 베트남어를 쓰고 친구 모두가 베트남인이지만 미국에서 집을 사고 세금을 낼 만큼 영어를 충분히 알고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여긴다면서 “45년이 지난 뒤 영어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이들이 외국인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어가 ‘외국적’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겐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라며 “‘영어’, ‘미국’ 자체가 단지 ‘백인임’과 엮일 때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현실 미국 사회에선 언어가 아닌 피부색이 더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디시어(유럽에서 쓰는 유대어) 대사가 대부분인 유대인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치자”라며 “그는 아마 이 영화가 미국 얘기라고 HFPA를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미나리와 다른 점은 스필버그는 당연히 미국인이고 정 감독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외국인 취급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을 지닌 젊은 영화제작자라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디시어가 미국 언어라면 왜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 산 한국인 이민자가 쓰는 한국어, 19세기부터 이민 온 중국인이 쓰는 중국어는 아닌가”라고 물었다.
응우옌은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미국인 가족의 얘기를 다룬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과 독일어와 불어가 대부분 나오는 ‘바스터즈-거친 녀석들’이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상까지 받았다면서 “도대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영화 ‘기생충’, BTS, 블랙핑크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연예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정수라면서, 기생충의 성공이 비(非)영어 영화를 제외하고 이를 주류와 분리하려는 미디어와 연예 산업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hskang@yna.co.kr